[문화카페] 남한산성에 깃든 해와 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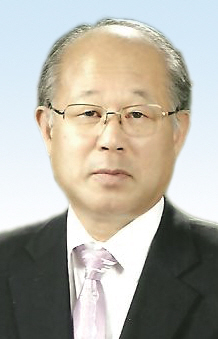
하늘에는 천지자연의 법칙이 있고,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궂은 일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을 하늘의 뜻이라 여기면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했다.
이렇듯 조상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늘의 섭리와 우주가 들려주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 소홀히 여기며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늘의 이치인 천문의 사상을 멀리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의 세계만을 키우는 데 급급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하여 많은 인파가 높은 산등성이로 또 동해바다로 몰리는 현상은 다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연관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섭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는 인간사의 근본이 된다. 생명의 근원과 터전인 자연의 움직임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과 천문의 세계를 실증적으로 활용한 예로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행궁을 살펴볼 수 있다. 남한산성은 서쪽은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형(西高東低形)의 자연 지세에 입지해 있다. 이러한 자연 지세를 존중하여 행궁 건물의 대부분은 동향으로 배치되었다. 자연 환경에 순응하여 조선왕조의 경도보장지로서의 또 하나의 한양인 남한 행궁을 지은 것이다.
또한 조선의 건축은 남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한 행궁 전체는 수어장대가 있는 서쪽 높은 봉우리, 즉 산성의 주봉 아래에 동향의 행궁을 지었다. 서쪽의 큰 산 밑에 위치해 있으니 지는 해가 더욱 일찍 넘어가는 형국이다. 입지상 일조량이 적은 곳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 또한 조상들의 깊은 뜻에서 계획된 것이다.
천기(天氣)를 살려 배향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지(冬至)와 하지(夏至)의 해 뜨고 해지는 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각별히 자리를 살펴서 행궁을 배치한 것이다.
즉, 남한 행궁은 겨울에 일찍 해를 받아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하여 동쪽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입지하였고, 동시에 산성 천주봉 아래로 해가 넘어는 곳에 입지했다. 가장 일조량이 많은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 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하지를 중심으로 한 여름날에는 아침 해가 산성 동쪽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가장 늦게 떠서 저녁에는 수어장대 주봉 정상 너머로 가장 일찍 진다. 따라서 일조량이 가장 적은 곳에 위치하여 여름에도 시원한 행궁이 되도록 건물의 방향을 배치했다. 천기를 알고 건축물인 행궁의 배향을 자리 잡은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건물의 배향을 정하는데도 이렇듯 자연의 이치를 살펴서 활용하는 지혜를 보였다.
이러한 남한산성 행궁의 천기를 떠올리면 조상님들의 지혜에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진다. 남한산성의 또 다른 이름인 ‘주장산(晝長山)’, ‘일장산(日長山)’에 하루 해가 길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남한 행궁 자체는 태양의 움직임과 관련 있는 한편 그 좌측 언덕의 능선에는 달맞이하는 정자 ‘영월정(迎月亭)’이 있어 흥미롭다. ‘해’와 빼놓을 수 없는 관련이 있는 ‘달’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함께 배치한 것이다.
산성에 깃들어 있는 해와 달의 이야기는 1000년 역사의 산성에 스며든 채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해와 달, 우주의 이야기에 마음을 더욱 쓰면서 욕심을 줄이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