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고쳐줄게요”

여섯 살 난 어린이는 하루에 300번, 정상적인 성인은 17번. 웃음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이다. 백만 불짜리 미소, 살인미소, 젊은미소… 웃음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싱그럽다. 정작 매일 17번조차 웃었던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던 때를 더듬어 보니 3일 전쯤인가 보다.
꽃이 이토록 관능적이어도 되는가하는 생각에 바쁜 걸음 잡아놓고 바라보는 동백꽃. 아직도 더러 남아있는 꽃샘추위 심술에 고뿔 날려버릴 날 없이 달고 살지만 봄의 정령 앞에서 붉은 입술 추워서 내어 준다는 김동인의 시 한 구절 떠올린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느 봄비 촉촉하던 날 처음 내어주고 설레던 입술 생각에 마음속 부끄러운 미소가 새어나온다. 역시 행복한 미소다.
점점 웃을 일 없어지는 요즘 두고두고 꺼내보는 감칠맛 나는 추억 다 모아도 입가를 생글거리게 만드는 일 어디 이만한 게 있으랴.
웃음에 인색해지는 어른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인정했던 웃음 관련된 속담이 맘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一笑一少一怒一老 웃는 문에 만복 든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얼굴 침 뱉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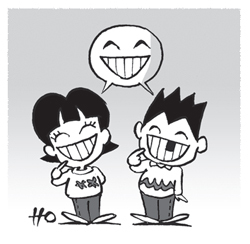
웃음만큼 소통이 잘되는 비언어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도 드물다. 얼굴표정, 눈빛, 제스처 등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삼는 신체 언어(body language)도 중요한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수단 중 하나이다. 무성영화 ‘찰리 채플린’을 보면서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것도 비언어 덕분이다. 이도 저도 다 차치하고 시인 정지용은 이렇게 읊었다 “웃지요” 이왕 웃을 거 확실하게 그냥 웃자는 말로 들린다.
웃음이 만병통치의 명약이라는 의미를 그날 동백꽃 아래서 배웠다. 동백나무 사이로 부서지는 고운 햇살을 받으며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에 다가가 물었다.
“너희는 이담에 뭐가 되고 싶어?”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한 아이가 답을 준다. “뭔가 어떤 거를 사람들 웃기고 신나게 하는 거 같은 거요.”
이 아이 눈에 어른들이 얼마나 웃지 않았으면 이런 꿈을 가졌을까 싶어 한 마디 더 물었다. “너무 너무 힘들어서 웃음을 아예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4살 난 여자 아이가 활짝 웃어 보이며 속삭인다. “다 이렇게 웃으라고 가르쳐서 고쳐줄게요”
이 미 숙 ㈔한국미디어연구소 선임연구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