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그 많던 책방은 어디로 다 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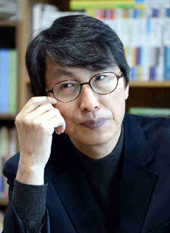
“사장님, 혹시 책방 하다가 잘못 되셨나요?”
나는 사장도 아니지만, 책방을 운영한 일도 없다. 요즘은 어디 가나 ‘사장님’이라는 소리가 남발 되고 있는데 그거야 세태 탓이려니 한다. 문제는 집안 가득한 책을 보고 집배원이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물은 ‘책방 하다가 잘못 되었느냐’는 것이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엔 전국에 5천 곳이 훌쩍 넘던 책방이 현재는 2천 곳에도 훨씬 못 미친단다. 이미 책방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나 생겨났고 서른 곳은 책방이 가까스로 한 개가 유지 되고 있단다. 이는 책을 자본주의의 다른 상품과 똑같이 여겨 일어난 현상이리라. 박완서 선생의 소설 제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투로 말하자면 ‘그 많던 책방은 어디로 다 갔을까?’
사정이 이러한지라 국회에서 지난 1월 9일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책값 할인율 상한을 19%에서 10%로 제한하면서 신간, 구간 구분 없이 모두 적용 대상으로 포함 시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발행된 지 1년 6개월, 즉 18 개월이 지난 책은 할인율에 제한이 없어 책 유통시장을 어지럽힌 주범으로 여겨졌다.
이에 출판계와 오프라인 책방은 아쉬운 대로 환영한다고 했지만 할인판매를 해온 온라인 서점은 반발했다. 출판계 쪽이나 오프라인 책방 쪽에선 할인 없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줄곧 외쳐왔다. 온라인 서점은 책을 싸게 살 소비자 권리를 내세우며 책을 할인해주지 않으면 누가 책을 사겠냐고 한다. 이는 책을 다른 상품과 똑같이 여긴다는 얘기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은 집에서 책을 받아보는 편리함에 마일리지니 쿠폰이니 하는 온갖 할인판매책으로 독자를 끌어 모았다. 그 결과 동네 책방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다. 물론 동네 책방이 사라진 게 온라인 서점만의 탓은 아니다. 대형 서점의 등장도 한몫했다는 의견이 많다.
어쨌든 할인 판매 정책을 중시한 온라인 서점의 사정은 좋아졌을까? 무리한 할인정책 등으로 경영 압박을 못 견뎌 이미 한 군데 대형 온라인 서점이 문을 닫았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온라인 서점도 할인율이 높고 대중이 선호하는 가벼운 책 위주로 판매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온라인 서점 주장대로 독자가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게 다 망가지는 지름길이라면?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판사가 애초에 책을 싸게 공급해야 한다. 출판사는 살아남기 위해 좋은 책보다는 가벼운 읽을거리 위주로 책을 펴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동네 책방도 대형 책방이나 온라인 책방 탓에 거의 사라져 출판사가 책을 공급할 데도 마땅치 않다.
내 발 딛고 서 있는 땅이 중요하다고 내 발이 놓이지 않은 땅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결국 자기가 발 딛고 있는 땅도 무너질 것이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일부 온라인 서점은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한다. 도서정가제가 무너져 출판사가 다 망하면 온라인 서점인들 무사할까?
자본주의의 상품 유통 방식이 만능은 아니다.
책은 다른 상품과는 더더욱 다르다. 그러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책을 일반 물건 취급하지 않고 보호한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시 후보로 나섰던 누구도 책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도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창조·창의력·인문을 들먹인다. 애들 말대로 다 ‘뻥!’이다. 이런 세상에 작가로 사는 게 기적이다. 누가 내 책을 읽어주는지, 그저 고마울 뿐이다.
아무튼, 요즘 유행하는 말투로 하자면 ‘책은 자본주의의 단순한 상품이 아니무니다!’
박 상 률 작가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