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관객 시대… 한국영화의 씁쓸한 현실
할리우드식 흥행요소 차용 승자 독식 시장으로 전락
영화산업의 현실 꼬집어

2천만 영화의 출현도 더이상 비현실적 예측이 아니다. 불과, 10여년 전 한국영화의 존폐를 언급하며 스크린쿼터 확대를 주장했던 그 때의 영화시장이 아니다. 혹자는 이러한 배경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극장의 수직적 계열화를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다.
수직적 계열화가 성립되지 않는 영화도 많고, ‘몰아주기’로도 실패한 영화도 많다. 과연, 천만 영화의 배경에 ‘시장논리’만이 작동하는 것일까?.
전작 <나쁜 세상의 영화사회학>(강 刊)에서 영화와 사회의 관계에 집중했던 저자 김경욱이 이번에는 <한국 영화는 무엇을 보는가>(강 刊)을 통해 ‘천만 관객 영화’를 분석했다.
저자는 1천4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국제시장>의 흥행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국제시장>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사회 쟁점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는 ‘박정희 시대의 귀환’이라는 징후를 포착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IMF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으로 이어져 마침내 ‘헬조선’까지 도달한 한국사회의 현실과도 맞딱뜨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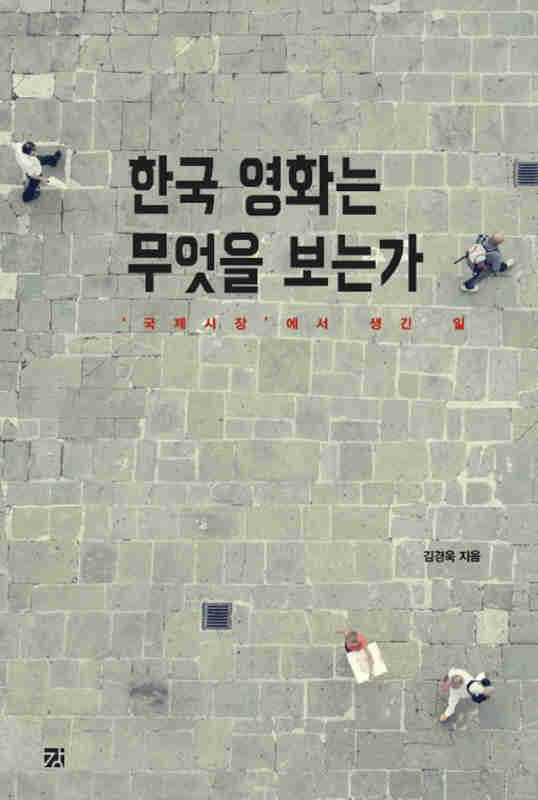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해운대>와 <국제시장>으로 쌍 천만 감독에 올라선 윤제균의 흥행 전략, 즉 하이콘셉트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윤 감독을 “한국 관객의 영화적 정서에 매우 정통한 감독”이라 평가하며, 데뷔작인 <두사부일체>부터 <국제시장>에도 이러한 정서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최대한 많은 흥행 요소를 집적하되, 현실 같은 판타지를 제시하고, 관객들을 웃고 울린다. 또 한국의 많은 흥행작이 할리우드 영화의 흥행 요소를 차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승자 독식 시장으로 전락한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을 꼬집는다.
멀티플렉스를 찾는 관객에게 영화는 비용 대비 만족도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만인 ‘상품’으로 소비된다. 여기에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에서 무엇이든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만들어낸 쏠림 현상이 천만 영화 출현의 배후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는다.
책은 영화 속 가부장제의 잔재부터, 신파 영화의 사회적 효용 등 다양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천만 관객 시대에 내밀히 접근한다. 값 1만4천원
박광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