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권력 정치의 속사정은?
문묘종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지식층들의 암투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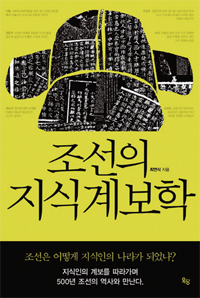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하고,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때에 이 시대의 한 지식인이 조선 시대의 지식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인전처럼 인물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던 과정에 주목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한다.
역사를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최연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쓴 <조선의 지식계보학> 의 내용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지식인의 경계가 분명했다. 지식인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인하는 ‘문묘종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묘종사는 유교의 성인(聖人) 공자의 사당인 문묘(文廟)에 조선에서 유학과 주자학에 위대한 공헌을 한 현인(賢人)들을 모셔놓는 것을 의미한다.
5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조선에서 이 반열에 오른 사람은 정몽주ㆍ김굉필ㆍ정여창ㆍ조광조ㆍ이언적ㆍ이황ㆍ김인후ㆍ이이ㆍ성혼ㆍ김장생ㆍ조헌ㆍ김집ㆍ송시열ㆍ송준길ㆍ박세채 등 단 15명뿐이었다.
저자는 이들이 조선의 대표 지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정치공학과 투쟁에 뒀다. 조선의 건국을 반대한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조선 건국에 동의하지 않다가 이방원에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반정(反正)의 당위성을 위해 중종은 정몽주를 부당한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지식인으로 만들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지식인이 국가의 인정을 받는 것은 개개인의 학문적 역량보다는 정치공학이나 투쟁에 가깝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또 이황, 이이, 김굉필, 조광조 등 다른 지식인들이 문묘에 종사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조선 권력 정치의 속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책은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지식국가 조선의 탄생을 다루고, 2부에서는 정몽주가 조선 지식인의 상징이 된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다. 3부는 김굉필ㆍ정여창ㆍ조광조ㆍ이언적ㆍ이황을 일컫는 5현과 이이ㆍ성혼 등이 문묘에 종사되는 과정을 그린다.
단순히 옛 조선 지식인들의 흥미로운 정치 이야기만 풀어놓은 건 아니다. 어떻게 지식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또 그 계보를 탄생시킨 당시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다보면 지식인들의 치열한 정쟁이 한 시대를 건강하게 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이 현재의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이유다. 값 1만6천원.
신지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