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규 장편소설 ‘서울’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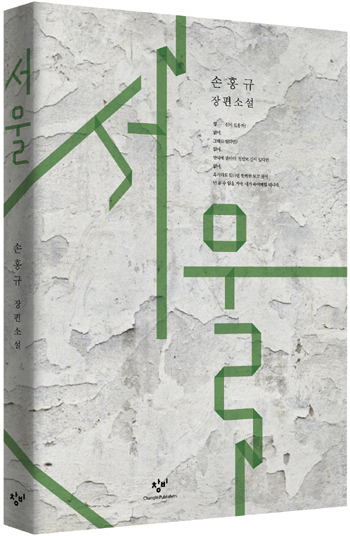
알 수 없는 이유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에서 동생과 함께 살아남은 소년이 있다. 건물들은 무너졌고, 거리에는 시체들이 즐비하며, 정체 모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어딘가에서는 비명과 신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거대도시 서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너무도 익숙한 ‘서울’이라는 공간인 까닭에, 그 세계는 한층 더 낯설고 당혹스럽게 다가온다.
손홍규의 새 장편소설 ‘서울’(창작과비평사刊)의 이야기다.
무너진 서울 곳곳의 거리와 소년의 내면 풍경을 교차하며 보여주는 소설은 낯선 만큼 강렬하고, 한편으로 읽는 이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것은 소설이 종말에 대한 익숙한 관념 대신 독특한 은유와 상징으로 이뤄진 숱한 예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 때문.
익숙했던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비명과 신음, 위험만이 가득한 서울에서 소년은 살아남아 동생을 지키는 것만을 목표로 길을 나선다.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들을 따르는 한마리의 개와, 남편을 잃은 여자와 그녀의 어린 딸, 그리고 소총으로 무장한 노인과 만나 그들과 일행이 된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살아남은 인간들의 증오에 찬 습격을 받으며 하루하루 위험하고 힘겨운 여정을 이어간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폐허 속으로 소년이 스스로를 내던지며 겪는 고통은 읽는 이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올 만큼 지독하기만 하다.

소설은 묻는다. 종말 이후는 이전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 종말 이전에도 ‘서울’에 속해 있지 않았던 이에게, 종말 이후의 서울은 무엇일 것인가. 종말 이전과 이후에 ‘우리’는, ‘타자’는 서로 무엇이 되는가. 소년은 매일같이 꿈에서 새로 태어나는 서울을 보고 있었다.
손홍규는 작가의 말에서 “소년이 왜 이 서울과 끝까지 불화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인간의 비밀이다. 소년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소년은 (…) 몰락 뒤에 펼쳐질 눈부신 지옥을 남겨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서울’은 세계와 불화하는 인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이자 인간과 불화하는 세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비밀을 품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소설이 그려 보이는 ‘서울’이라는 비밀의 공간에서 우리 자신의 비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서울’이 우리에게 주는 묵직하고 눈부신 경험이다.
값 1만2천원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