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식 장편소설 ‘불의 기억’ 출간
욕망과 예술을 향한 두 종쟁이의 광기어린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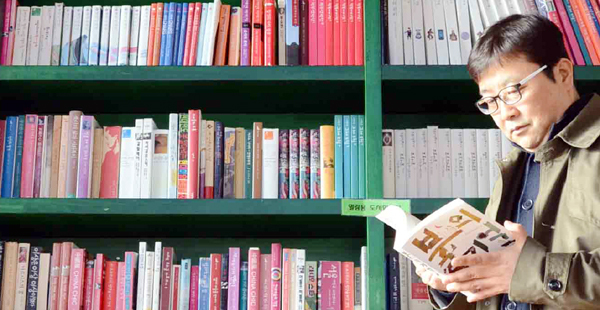
그래서 긴 무명시절 동안 먹고살기 위해 대필을 하며 ‘유령작가’로 살면서 겪은 작가의 파란만장한 20년 인생사가 더 큰 화제를 모았다. 1년 만에 두 번째 장편소설 ‘불의 기억(은행나무刊)’을 들고 돌아온 전민식 작가를 딱,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1년 새 전민식은 ‘유령작가’에서 ‘유명작가’가 돼 있었다. 이제 새벽시장에 나가 막노동하지 않고, 대필하지 않고도 본인만의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그러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
그는 등단 1년 만에 내놓은 신작 ‘불의 기억’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종(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과감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습작 기간에 각종 문학상 최종심에만 아홉 번이나 거론됐던 작가에게 다양한 소재의 총알(소설)이 있었을 텐데 왜, 종 이었을까.
“20여 년 전 성덕대왕신종과 상원사의 종소리를 듣고 처음 구상한 후, 꾸준한 공부와 인터뷰를 토대로 3번 정도 변주해 본 끝에 이번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소재였기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쓸까봐 조마조마했다.(하하) 이 녀석(불의 기억)도 최종심에 올라갔다 고배를 마신 작품이다.”

오래 품고 갈고 닦은 세월만큼이나 장인 수준의 해박한 지식과 육화된 묘사와 예술미 넘치는 문장이 압권이다. 단순하게 종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작가는 신라시대 ‘종에 사람을 넣었다’는 설화를 차용해 서스펜스를 조장하며 소설적 긴장과 흡입력을 증폭시킨다. 게다가 그는 평생의 역작으로 남을 종 제작에 자신을 내던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낸다. 수천도의 뜨거운 불 속에서 종을 직접 만들어본 종쟁이처럼 말이다.
“서울대출판사에서 나온 800페이지 상당의 종에 관한 서적을 50번 넘게 탐독했습니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전국 사찰은 다 찾아다니며 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작가는 종을 만들어 본적도, 종쟁이와 산 적도 없다 했다. 그런데 어떻게 종에 대한 이 길고 긴 서사와 묘사가 가능했을까. 작가는 유년기와 청년기 유랑의 체험을 작품에 적절하게 녹여내 ‘규철’과 ‘한위’ 두 종쟁이와 그들 각각의 자녀인 네 명의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삶이라는 고독한 싸움과 방랑의 세월을 입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치명적 욕망과 사랑이 뒤엉킨 잔혹하고 아름다운 인간 드라마를 탄생시켰다.
전민식 작가는 “소설을 쓰면서 살아내는 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쉴 새 없이 올해 안에 2권의 소설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