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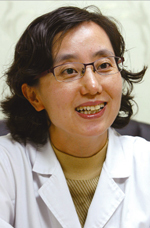
지난 5월29일, 가수 션씨의 시작으로 시작된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2014년 여름 미국에서 시작된 SNS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원조다. 이 캠페인 참가자는 세 명을 지목해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 얼음물을 뒤집어쓰든지 100달러를 루게릭병 단체에 기부하라”고 한다.
얼음물을 뒤집어쓰며 서서히 근육이 수축하는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이를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한 운동에 많은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고 국내서도 많은 유명인사가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도 불리는 루게릭병이란 어떤 질병일까.
이 질환은 뇌, 뇌간, 척수에 존재하는 운동 신경원이 퇴행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의 신경이 파괴되는 것이다. 또한 전신에 분포한 수의근(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운동신경 자극을 받지 못한 근육들이 쇠약해지고 자발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근이 마비돼 호흡 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1930년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루게릭(Lou Gehrig)이 이 질환을 앓게 되면서 루게릭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 몸의 모든 자발적 움직임은 상위운동신경세포와 하위운동신경세포의 협력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주먹을 쥐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뇌에서 상부운동신경원을 통해 손 근육을 통제하는 부위의 척수로 ‘주먹을 쥐라’는 명령을 전달한다. 그다음 척수에서 해당 근육으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우리는 주먹을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상부운동신경원인 뇌가 망가지면 척수로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뇌의 통제에서 벗어난 척수는 자기 마음대로 근육에 명령을 보내고, 근육은 긴장이 지나쳐 경직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부운동신경이 망가지면 척수는 근육에 전혀 명령을 보내지 않게 되고, 근육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환자마다 증상 정도가 다르지만 다리의 힘이 빠져 보행이 어려워진다거나, 팔이나 손의 힘이 빠지거나, 혹은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음식물 등을 삼키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환자 인지 기능도 저하되기도 한다.
루게릭병 치료는 발병 원리 및 경과 등에 맞추어 여러 가지 약물이 개발 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약제는 없다. 다만 루게릭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제로 해외에서 인정받은 치료제 리루졸이 있다.
리루졸은 글루타민산이 신경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약으로 루게릭병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단 파괴된 신경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멈추거나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루게릭병은 자기공명영상이나 혈액검사로 진단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증상과 함께 경험 많은 의료진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한다. 가족력이 있거나 발병 연령이 어리다든지 하는 유전자 이상이 의심되면 전문적인 연구기관 도움을 받아야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원장
댓글(0)
댓글운영규칙












